
 | Name | 천일야사·Ⅳ |
| Type (Ingame) | 임무 아이템 | |
| Family | Book, 천일야사 | |
| Rarity | ||
| Description | 재앙의 시대의 어느 떠돌이 학자가 우림, 사막, 도시를 여행하며 수집하고 정리한 이야기집. 원작에 담긴 이야기는 무궁무진했으나, 지금은 일부 단편만 남았다고 한다 |
Item Story
| 학자의 이야기 오래전 한 학자가 있었다. 그는 보통 글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고고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다. 비록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그는 결코 뛰어난 학자가 아니었지만 말이다. 학문은 마치 과일과도 같다. 시간은 빠르게 과일의 신선도를 빼앗아 간다. 과즙이 풍성할 때 그것을 먹어 치울 수 없다면 남은 건 냄새나는 썩은 과일뿐이다. 「시간은 나의 적이다.」 젊은 학자는 이렇게 생각했다. 「동료들보다 훨씬 더 짜증 나는 자식이지.」 하지만 게으른 천성은 절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.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「짜증 나는 동료」들이 수많은 경력을 쌓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동안 학자에게 남은 건 세월의 흔적뿐이었다.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?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소원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된다. 「시간은 공평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. 내 머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돌아가지 않는 건 절대 내 재능이 떨어져서가 아니야. 시간이 나한테만 유난히 엄격해서라고…」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은 학자는 이렇게 생각했다. 「그런 나에게 이런 기회가 생겼으니 무조건 잘 이용해야겠어.」 그래서 학자는 지니에게 이런 소원을 빌었다: 「저는 공평한 시련을 원합니다… 제가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말이죠.」 지니는 바로 학자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챘다. 「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야.」 지니가 말했다. 「잘 아시겠지만 전 이미 그 대가 중 일부를 치렀습니다.」 학자가 어깨를 으쓱했다. 「전 아무 의미도 없는 추격전에 젊은 시절을 허비했습니다. 이렇게 된 이상, 전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따위는 바라지 않습니다. 전 그저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저작을 남겨 제 이름이 세세 대대로 칭송받길 원할 뿐입니다. 언젠가 부식될 종이 위에 남아 사라지는 먹이 아닌 바위에 새겨지고 싶습니다. 수백, 수천 년이 지나도 제 흔적이 남을 수 있게요. 공정함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시간도 이길 수 있습니다.」 「그렇게 원한다면…」 지니는 별말 없이 학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었다. 그것이 정말 지니였는지 아니면 지니의 탈을 쓴 악마였는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지금은 그것을 의논할 때가 아니다.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자… 소원을 이룬 학자는 놀랍게도 주위의 모든 것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발견했다. 「좋아. 아주 좋아. 이제 나보다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없어.」 소원을 이룬 학자는 꽤 만족스러웠다. 학문을 깊이 생각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었다. 모래시계의 모래 한 알이 떨어지는 순간, 손을 들어 이마를 만질 수도 없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학자는 마음껏 생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었다. 밀림에서 사막으로, 황야에서 설원으로… 학자의 생각은 책을 따라 끝없이 펼쳐졌다. 책장을 펼치는 시간이 아까워 책의 모든 내용을 큰 종이 한 장에 적고 싶을 정도였다. 하지만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그의 눈동자는 결코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다. 그의 시선이 단어 하나에 닿는 순간, 학자는 이 단어와 관련된 모든 어휘와 모든 상상력을 다 쏟아냈으니까. 「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쓰지 않는 건 의미가 없어.」 얼마 후, 학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. 「가장 화려한 단어로 이 완벽한 논리를 기록해야겠어.」 하지만 학자가 첫 글자를 쓴 순간, 그의 생각은 이미 문장의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. 학자는 자신이 발표하려는 문장을 수없이 되뇌었고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그 문장은 점점 더 완벽해져 갔다. 하지만 이 모든 건 그의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졌을 뿐, 그가 드디어 역작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 순간, 그의 오른손은 이제 겨우 일곱 번째 글자를 쓰고 있었다. 학자의 몸은 가장 화려한 단어로 가장 완벽한 논리를 입증했어야 할 논문을 써내기에 역부족이었다. 결국 그가 써낸 작품은 책을 갈기갈기 찢어 아무렇게나 흩뿌려놓은 듯했다. 무작위로 적혀진 조각난 글들을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리가 없었다. 그날은 별 하나 없는 어두운 밤이었다. 겨우 서재에서 정원으로 나온 것뿐이었지만 학자는 백 년 동안의 원정을 끝낸 듯 지쳐버리고 말았다. 「글로 쓰는 것보다 차라리 말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. 더 직접적이니까.」 학자는 여전히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. 하지만 그의 발성기관도 학자의 뛰어난 사고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. 한마디를 채 끝내기 전에 그의 생각은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렸고 결국 학자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흐느낌 같은 중얼거림뿐이었다. 「불쌍한 사람! 악마에 씐 걸까?」 화려한 옷차림의 청년 남녀가 학자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냈다. 「그래도 달빛만은 저 사람의 곁을 지켜주니 다행이네.」 두 사람은 그 말만을 남긴 채 자리를 떠버렸고 달빛이 비치는 정원에는 학자만이 덩그러니 남고 말았다. 육체라는 굴레에 갇힌 그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었다. 그저 자신이 읽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되돌이켜 볼 뿐…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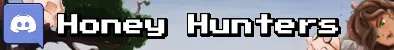



mávuika eu quero ela